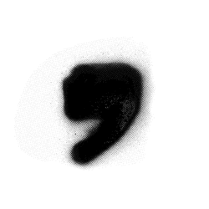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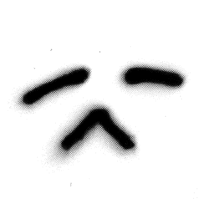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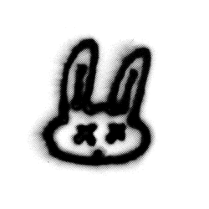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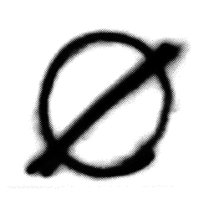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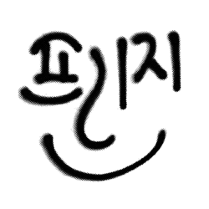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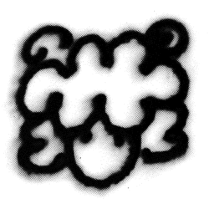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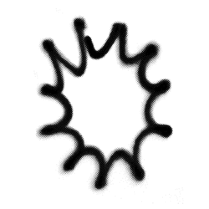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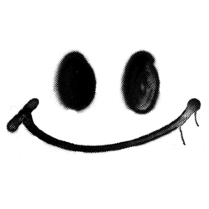
프린지와 협업 한다는 것
- m t o 민,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1 비주얼디렉터
2018년을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4번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비주얼 디렉터로 참여했다. 2번은 코로나 이전에, 2번은 코로나 이후에 치르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1번, 문화비축기지에서 2번, 그리고 마포 일대에서 1번 치렀다. 4년은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변화와 시도의 기간으로서 짧게 느껴지기도 했다.
비주얼 디렉터의 축제 준비는 메인 포스터의 논의로 시작된다.
매해 특정 이야기로 펼치는 축제가 아니다 보니, 대표 키워드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2018년은 프린지다운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해였고, 2019년 예술아지트, 2020년 블랙리스트, 2021년 자유, 교감과 같은 각 시기를 어우르는 대표 키워드를 정하고 이미지를 그려나갔다.
2018년 첫 미팅 날, 지난 축제의 결과물을 전달받았다. 정성이 깃든 지난 결과물의 보며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팅에서 마주한 스태프들의 에너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젊고 팡팡 튀는 느낌을 전달하는 건 어떨까’, ‘더 친숙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대중에 친숙한 축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다. 그 결과, 형형색색 다양한 컬러 로 축제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에게도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공간에도 알록달록한 컬러를 입혀, 전반적으로 화사한 축제의 인상을 더했다. 2019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졌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생각의 토대를 전환하게 되었다.
프린지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 해 한 해 알아갈수록, 가볍기만 한 축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가시화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열린 축제라는 점, 비대면으로 나아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All 대면 공연의 선언은 단순히 예술축제 이상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프린지를 밝고 에너지 넘치는 천진한 청년으로 느꼈었다면, 지금은 규제에 도전하고 강제에 질문하는 ‘이단아’로 느껴졌다. 이러한 상상으로 포스터를 그려나갔는데, 2020년은 모자이크된(검열된) 이미지를 뚫고 나오는 에너지로 표현해 보았고, 2021년은 스프레이로 과감히 낙서해 자유로이 표현하는 느낌을 그려보았다.
공간, 거대한 공간을 디자인하기(공간과 타협하기)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정말 거대했다. 2018년 프린지는 월드컵경기장에서의 4번째 축제였다. 이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많은 실험이 끝난 후였다. 경기장은 너무 거대했고, 무엇을 가져다 놓아도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각 공간의 쓰임과 동선이 먼저 결정이 되었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환영(Welcome)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 멀리서도 ‘아 저기에서 프린지가 열리는구나’ 알 수 있게 만드는 일. 실제로 가보면 너무 멀어 손톱만 하게 보이는 게이트이지만, 계단을 올라갈수록, 축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색색의 천막이 머리 위에서 일렁이고, 누군가는 그늘 아래에서 그네를 타며 바람을 느낄 수 있게 꾸몄다. 우리가 설치한 기둥은 길이가 4미터가 넘지만, 경기장의 위압감에 그 크기를 드러내기 쉽지 않았다.
2019년부터 축제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다. ‘기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상 공간과 거리가 있는, 은폐된 느낌의 공간이었다.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색다른 장소지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 흩어진 공간들을 통합하고 시각적인 이목을 끌어야 하는 동시에 공간의 매력과 가시성을 높여야 하는 비주얼 디렉터에게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거대한 공원을 모두 꾸미는 대신, 메인 공간에 집중했다. 비축기지의 특색을 살려, 길을 따라 올라오면 동산과 함께 ‘프린지 랜드’가 펼쳐지는 상상력을 동원했다. 트리하우스를 모티브 삼아 철골구조와 합판 몇 개로 쌓아 올린 ‘아지트’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
 몇 해의 경험이 쌓여가며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다.
몇 해의 경험이 쌓여가며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다.
2018년, 월드컵경기장에서의 축제는 바람과 싸운 해로 기억하고 있다. 입구에 거대한 게이트를 세우고, 주변의 가로등과 아시바에 천을 늘어뜨려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시도를 했었다. 게이트를 설치할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덥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대가 높아서였을까, 공기가 선선해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너무 세서 주변의 기물에 간섭을 일으키거나, 설치해 둔 파라솔이 바람이 떠밀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다. 대자연에 맞서며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난다. (이때 이후로 바람 노이로제가 생겼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바람을 막기보다는 역으로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깃발의 형태를 차용했다. 바람에 저항할 필요가 없으니 지지하고 있는 기둥의 무게가 무겁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다. 공원 입구, 언덕길, 그리고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서 깃발이 펄럭이며 바람과 어우러지는 공간디자인을 진행 했다. 때때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였다.
당시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포스터의 판형이다. 축제가 열리기 한 달 전, 후원회원과 관계자들에게 축제를 알리는 꾸러미를 보내곤 한다. 여기에는 안내 책자와 기념품, 초대권 등이 포함되는데, 커다란 포스터도 여기에 포함 된다. 처음 받아보고 놀랐다. ‘아촤촤’. 포스터는 펼쳐 붙이는 형태만 상상하다가, 1/4 사이즈로 접혀 발송되는 형태는 예상하지 못했다. 도톰한 종이를 썼던 탓에 접힌 부분이 찢어지기도 하고, 펼쳤을 때 접기 이전의 온전한 느낌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이때의 아쉬움은 ‘판형을 1/4사이즈로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네 장이 하나의 포스터가 되는 것이다. 가려지고, 드러나고, 반복되는 디자인의 특징과 잘 어울리는 형식이었다. 이는 최종적으로 8종 포스터로 확장되어 한 단어로는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프린지의 색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고, 프린지에서 흔쾌히 수락해주어 A4형태의 포스터로 완성되게 되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린지
프린지의 비주얼디렉터로 시간을 보내며, 여름은 항상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기분이었다. 매해 새로운 시도였고, 낯설고,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많았다.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 프린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을 진행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프린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결과물이 매력 있고 멋져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낀 프린지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매력을 잘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디자인이 멋졌다면, 프린지가 멋진 탓이고, 디자인이 아쉬웠다면, 비주얼 디렉터로써 프린지를 잘 담아내지 못한 탓이다.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를 주도하는 스태프들의 힘이 원천이 되어 프린지는 완성된다. 디자인은 조미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프린지를 설명하는 주재료는 아니지만, 프린지의 풍미를 더 잘 살려주는 재료. 그간의 노력이 프린지의 멋진 조미료가 되었길 바라본다.
비주얼 디렉터의 축제 준비는 메인 포스터의 논의로 시작된다.
매해 특정 이야기로 펼치는 축제가 아니다 보니, 대표 키워드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2018년은 프린지다운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해였고, 2019년 예술아지트, 2020년 블랙리스트, 2021년 자유, 교감과 같은 각 시기를 어우르는 대표 키워드를 정하고 이미지를 그려나갔다.
2018년 첫 미팅 날, 지난 축제의 결과물을 전달받았다. 정성이 깃든 지난 결과물의 보며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팅에서 마주한 스태프들의 에너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젊고 팡팡 튀는 느낌을 전달하는 건 어떨까’, ‘더 친숙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대중에 친숙한 축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다. 그 결과, 형형색색 다양한 컬러 로 축제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에게도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공간에도 알록달록한 컬러를 입혀, 전반적으로 화사한 축제의 인상을 더했다. 2019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졌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생각의 토대를 전환하게 되었다.
프린지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 해 한 해 알아갈수록, 가볍기만 한 축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가시화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열린 축제라는 점, 비대면으로 나아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All 대면 공연의 선언은 단순히 예술축제 이상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프린지를 밝고 에너지 넘치는 천진한 청년으로 느꼈었다면, 지금은 규제에 도전하고 강제에 질문하는 ‘이단아’로 느껴졌다. 이러한 상상으로 포스터를 그려나갔는데, 2020년은 모자이크된(검열된) 이미지를 뚫고 나오는 에너지로 표현해 보았고, 2021년은 스프레이로 과감히 낙서해 자유로이 표현하는 느낌을 그려보았다.
공간, 거대한 공간을 디자인하기(공간과 타협하기)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정말 거대했다. 2018년 프린지는 월드컵경기장에서의 4번째 축제였다. 이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많은 실험이 끝난 후였다. 경기장은 너무 거대했고, 무엇을 가져다 놓아도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각 공간의 쓰임과 동선이 먼저 결정이 되었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환영(Welcome)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 멀리서도 ‘아 저기에서 프린지가 열리는구나’ 알 수 있게 만드는 일. 실제로 가보면 너무 멀어 손톱만 하게 보이는 게이트이지만, 계단을 올라갈수록, 축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색색의 천막이 머리 위에서 일렁이고, 누군가는 그늘 아래에서 그네를 타며 바람을 느낄 수 있게 꾸몄다. 우리가 설치한 기둥은 길이가 4미터가 넘지만, 경기장의 위압감에 그 크기를 드러내기 쉽지 않았다.
2019년부터 축제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다. ‘기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상 공간과 거리가 있는, 은폐된 느낌의 공간이었다.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색다른 장소지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 흩어진 공간들을 통합하고 시각적인 이목을 끌어야 하는 동시에 공간의 매력과 가시성을 높여야 하는 비주얼 디렉터에게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거대한 공원을 모두 꾸미는 대신, 메인 공간에 집중했다. 비축기지의 특색을 살려, 길을 따라 올라오면 동산과 함께 ‘프린지 랜드’가 펼쳐지는 상상력을 동원했다. 트리하우스를 모티브 삼아 철골구조와 합판 몇 개로 쌓아 올린 ‘아지트’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8 공간 디자인 @서울월드컵경기장
2018년, 월드컵경기장에서의 축제는 바람과 싸운 해로 기억하고 있다. 입구에 거대한 게이트를 세우고, 주변의 가로등과 아시바에 천을 늘어뜨려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시도를 했었다. 게이트를 설치할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덥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대가 높아서였을까, 공기가 선선해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너무 세서 주변의 기물에 간섭을 일으키거나, 설치해 둔 파라솔이 바람이 떠밀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다. 대자연에 맞서며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난다. (이때 이후로 바람 노이로제가 생겼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바람을 막기보다는 역으로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깃발의 형태를 차용했다. 바람에 저항할 필요가 없으니 지지하고 있는 기둥의 무게가 무겁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다. 공원 입구, 언덕길, 그리고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서 깃발이 펄럭이며 바람과 어우러지는 공간디자인을 진행 했다. 때때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였다.
당시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포스터의 판형이다. 축제가 열리기 한 달 전, 후원회원과 관계자들에게 축제를 알리는 꾸러미를 보내곤 한다. 여기에는 안내 책자와 기념품, 초대권 등이 포함되는데, 커다란 포스터도 여기에 포함 된다. 처음 받아보고 놀랐다. ‘아촤촤’. 포스터는 펼쳐 붙이는 형태만 상상하다가, 1/4 사이즈로 접혀 발송되는 형태는 예상하지 못했다. 도톰한 종이를 썼던 탓에 접힌 부분이 찢어지기도 하고, 펼쳤을 때 접기 이전의 온전한 느낌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이때의 아쉬움은 ‘판형을 1/4사이즈로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네 장이 하나의 포스터가 되는 것이다. 가려지고, 드러나고, 반복되는 디자인의 특징과 잘 어울리는 형식이었다. 이는 최종적으로 8종 포스터로 확장되어 한 단어로는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프린지의 색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고, 프린지에서 흔쾌히 수락해주어 A4형태의 포스터로 완성되게 되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린지
프린지의 비주얼디렉터로 시간을 보내며, 여름은 항상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기분이었다. 매해 새로운 시도였고, 낯설고,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많았다.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 프린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을 진행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프린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결과물이 매력 있고 멋져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낀 프린지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매력을 잘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디자인이 멋졌다면, 프린지가 멋진 탓이고, 디자인이 아쉬웠다면, 비주얼 디렉터로써 프린지를 잘 담아내지 못한 탓이다.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를 주도하는 스태프들의 힘이 원천이 되어 프린지는 완성된다. 디자인은 조미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프린지를 설명하는 주재료는 아니지만, 프린지의 풍미를 더 잘 살려주는 재료. 그간의 노력이 프린지의 멋진 조미료가 되었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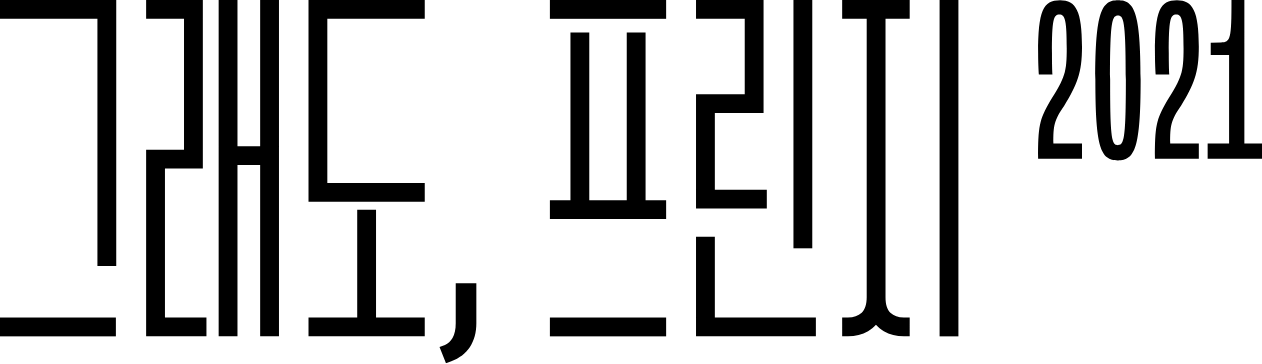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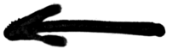 BACK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