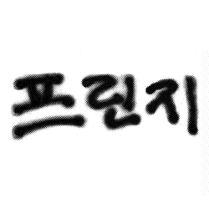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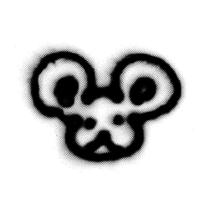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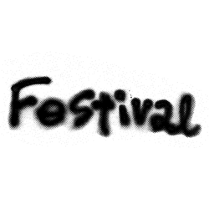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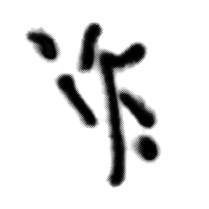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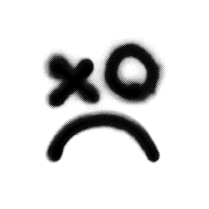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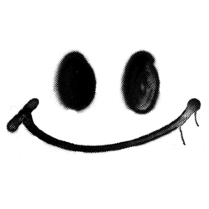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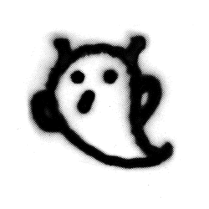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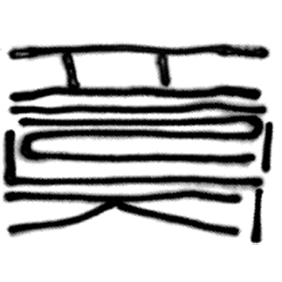
여름의 호흡은 덥고, 자유는 뜨겁지
- 숨,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1 캠페인이벤트팀 인디스트
올해 가장 흥행했던 프로그램인 Mnet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서 탄생한 유행어 중에 ‘케라라케’라는 말이 있다. ‘케이팝 퍼포먼스 하면 라치카, 라치카 하면 케이팝 퍼포먼스’의 줄임말인데, 나는 이를 차용해서 ‘여프프여’ 라고 하고 싶다. ‘여름 하면 프린지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하면 여름’.
두 번의 여름을 프린지와 함께 한 나에게, 프린지는 어느새 여름의 대명사가 되었다. 2020년, 문화비축기지에서 인디스트 명찰을 달고 쏘다녔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지만, 활동 기간 자체가 짧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 그 아쉬움은 올해의 나를 또 프린지로 이끌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8월 한 달 내내 축제가 진행되었고, 나는 마지막 여름방학을 프린지와 함께 후회 없이 보내고야 말겠다는 야심 같은 게 있었기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프린지에 쏟으려고 노력했다. 또 사실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면서 치유받고 싶은 마음도 컸다. 프린지는 나를 살게 하는 기억이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할 수 있다.
처음 캠페인이벤트 팀에 지원할 때는 고민이 많았다. 작년에는 없었던 팀이기도 하고, 기획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 내 존재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그래도 성실함과 책임감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기획을 못 하면 서포트를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냅다 지원했었다. 그 ‘냅다’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모두가 한 명 한 명 다 빛나는 사람들이었다.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7월에 처음 줌에서 자기소개하고 회의 진행할 때는 세상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ᄏᄏ) 한 달을 베이스캠프에서 열심히 회의하고 이것저것 진행하고 하다 보니 정말로 동지애 같은 게 생긴 기분이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말 많지만, 개인적으로 우리의 ‘근본’은 축제 첫 주에 팀원들이 모두 모여 포토존을 꾸몄던 날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단순한 업무인데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갔던 것 같다. 아직도 그날의 매직칠과 가위질을 생각하면……. 캠페인이벤트 팀의 첫 활동으로서 포토존 제작 및 설치가 중요했던 이유는, 세상에 최초로 공개되는 우리 기획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우리가 어떤 팀인지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 내는 기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인디스트 전체 단톡방에 올라오는 포토존 인증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내 새끼 보는 것처럼 뿌듯했다. 스탭들도, 인디스트들도, 관객들도 포토존과 함께 찍은 사진들 오래오래 간직해주었으면 좋겠다.
 포토존이 캠페인이벤트 팀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거사(巨事)는 뭐니뭐니 해도 관객과의 대화 기획 프로그램인 <친절한 린지씨>였다. 나를 포함해 다들 프린지에 지원할 때만 해도 관객과의 대화를 ‘직접’ 진행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ᄂᄋᄀ…!!). 지금 생각해봐도 캠페인이벤트 팀으로 활동하면서 프린지에서 할 수 있는건 정말 다 했다. 하하. 나도 진행자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아보겠냐’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자원했었다.
포토존이 캠페인이벤트 팀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거사(巨事)는 뭐니뭐니 해도 관객과의 대화 기획 프로그램인 <친절한 린지씨>였다. 나를 포함해 다들 프린지에 지원할 때만 해도 관객과의 대화를 ‘직접’ 진행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ᄂᄋᄀ…!!). 지금 생각해봐도 캠페인이벤트 팀으로 활동하면서 프린지에서 할 수 있는건 정말 다 했다. 하하. 나도 진행자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아보겠냐’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자원했었다.
내가 진행자로 참여한 공연은 ‘정지’의 <장미>였는데, 심지어 공연장이었던 ‘서촌공간 서로’의 크기가 크지 않고 무대가 객석보다 낮은 구조라 그냥 의자도 마이크도 없이 바닥에 철푸덕 앉아 생목소리로 진행했었다. 이것이 Real Fringe…?! 도저히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진행을 하는 약 30분간 내 정신줄을 꽉 붙들어 맸던 긴장감,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치던 관객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의 눈빛, 마지막 인사 후 터져 나오던 박수 소리 같은 것들. 그날 이후 약간의 깡따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워낙에 중대한 프로젝트였고, 많은 팀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회의하고 다듬어 온 기획이었으며, 더군다나 나는 친절한 린지씨를 진행했던 날이 인디스트 활동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완주했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다. 이 정도면 마지막 여름방학을 후회 없이 보낸 것 같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팀 정말 수고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토록 멋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꼭 전해주고 싶다.
다만, 올해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인디스트가 대략 120명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중 극히 일부와 대면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유일한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다. 축제가 무사히 끝난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말이다. 다른팀의 인디스트들이 프린지에서 어떤 기억과 경험을 가져갔는지 나는 알수 없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시공간에 기인하여 내가 프린지에서 얻은 가장 커다란 가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의 주체가 되어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경험’임을 밝히고, 이것을 다른 인디스트들도 비슷하게 느꼈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심에는 없는 것이 프린지에는 있다.
앞서 ‘여프프여’를 얘기했다. 여름과 프린지는 비슷한 구석이 많다. 줄줄이 나열하지 않아도 프린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여름과 프린지를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여름에도, 프린지에도 반짝이는 것들이 아주 많다. 영원히 파도치는 해안가의 뜨겁게 반짝거리는 모래알을 한 움큼 손에 쥐는 감각으로. 나는 여름을, 그리고 프린지를 살았다.
손에 쥔 건 언젠가 놓기 마련이다. 이 글을 쓰는 이곳은 겨울이다. 모래알은 그곳에 두고 왔지만, 그곳을 떠나온 나는 모래알을 느꼈던 손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영영 반짝일 것이다. 그리움은 그렇게 체화하면 된다.
두 번의 여름을 프린지와 함께 한 나에게, 프린지는 어느새 여름의 대명사가 되었다. 2020년, 문화비축기지에서 인디스트 명찰을 달고 쏘다녔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지만, 활동 기간 자체가 짧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 그 아쉬움은 올해의 나를 또 프린지로 이끌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8월 한 달 내내 축제가 진행되었고, 나는 마지막 여름방학을 프린지와 함께 후회 없이 보내고야 말겠다는 야심 같은 게 있었기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프린지에 쏟으려고 노력했다. 또 사실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면서 치유받고 싶은 마음도 컸다. 프린지는 나를 살게 하는 기억이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할 수 있다.
처음 캠페인이벤트 팀에 지원할 때는 고민이 많았다. 작년에는 없었던 팀이기도 하고, 기획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 내 존재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그래도 성실함과 책임감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기획을 못 하면 서포트를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냅다 지원했었다. 그 ‘냅다’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모두가 한 명 한 명 다 빛나는 사람들이었다.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7월에 처음 줌에서 자기소개하고 회의 진행할 때는 세상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ᄏᄏ) 한 달을 베이스캠프에서 열심히 회의하고 이것저것 진행하고 하다 보니 정말로 동지애 같은 게 생긴 기분이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말 많지만, 개인적으로 우리의 ‘근본’은 축제 첫 주에 팀원들이 모두 모여 포토존을 꾸몄던 날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단순한 업무인데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갔던 것 같다. 아직도 그날의 매직칠과 가위질을 생각하면……. 캠페인이벤트 팀의 첫 활동으로서 포토존 제작 및 설치가 중요했던 이유는, 세상에 최초로 공개되는 우리 기획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우리가 어떤 팀인지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 내는 기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인디스트 전체 단톡방에 올라오는 포토존 인증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내 새끼 보는 것처럼 뿌듯했다. 스탭들도, 인디스트들도, 관객들도 포토존과 함께 찍은 사진들 오래오래 간직해주었으면 좋겠다.

관객과의 대화 <친절한린지씨> 진행 사진
내가 진행자로 참여한 공연은 ‘정지’의 <장미>였는데, 심지어 공연장이었던 ‘서촌공간 서로’의 크기가 크지 않고 무대가 객석보다 낮은 구조라 그냥 의자도 마이크도 없이 바닥에 철푸덕 앉아 생목소리로 진행했었다. 이것이 Real Fringe…?! 도저히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진행을 하는 약 30분간 내 정신줄을 꽉 붙들어 맸던 긴장감,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치던 관객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의 눈빛, 마지막 인사 후 터져 나오던 박수 소리 같은 것들. 그날 이후 약간의 깡따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워낙에 중대한 프로젝트였고, 많은 팀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회의하고 다듬어 온 기획이었으며, 더군다나 나는 친절한 린지씨를 진행했던 날이 인디스트 활동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완주했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다. 이 정도면 마지막 여름방학을 후회 없이 보낸 것 같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팀 정말 수고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토록 멋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꼭 전해주고 싶다.
다만, 올해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인디스트가 대략 120명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중 극히 일부와 대면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유일한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다. 축제가 무사히 끝난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말이다. 다른팀의 인디스트들이 프린지에서 어떤 기억과 경험을 가져갔는지 나는 알수 없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시공간에 기인하여 내가 프린지에서 얻은 가장 커다란 가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의 주체가 되어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경험’임을 밝히고, 이것을 다른 인디스트들도 비슷하게 느꼈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심에는 없는 것이 프린지에는 있다.
앞서 ‘여프프여’를 얘기했다. 여름과 프린지는 비슷한 구석이 많다. 줄줄이 나열하지 않아도 프린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여름과 프린지를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여름에도, 프린지에도 반짝이는 것들이 아주 많다. 영원히 파도치는 해안가의 뜨겁게 반짝거리는 모래알을 한 움큼 손에 쥐는 감각으로. 나는 여름을, 그리고 프린지를 살았다.
손에 쥔 건 언젠가 놓기 마련이다. 이 글을 쓰는 이곳은 겨울이다. 모래알은 그곳에 두고 왔지만, 그곳을 떠나온 나는 모래알을 느꼈던 손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영영 반짝일 것이다. 그리움은 그렇게 체화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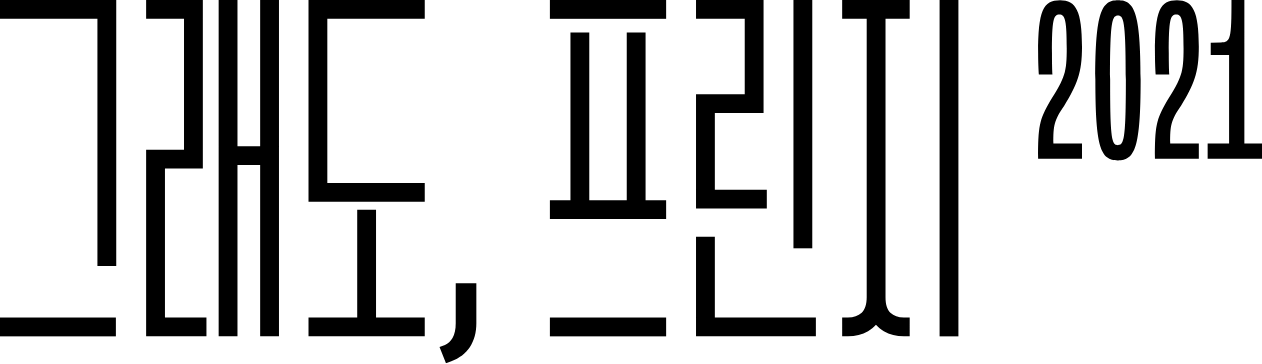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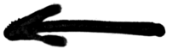 BACK
BACK